|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LCA
- 내란수괴
- 내란수괴 윤석열
- 티스토리챌린지
- 유니온 파인드
- 알고리즘
- 파비우스 전략
- 윤석열 내란수괴
- ccw
- DP
- dfs 백트래킹
- union find
- 백준
- 투 포인터
- 왈왈왈
- 이분 탐색
- BFS
- Prim
- dfs
- 오블완
- 내란죄
- 비상계엄
- 민주주의
- 프림
- 재귀함수
- 분할정복
- 다익스트라
- 윤석열
- 구조론
- Python
- Today
- Total
Toolofv 님의 블로그
일본의 영아 살해 풍습, 마비키(まびき)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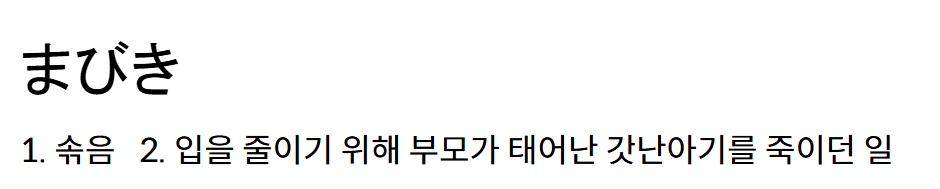
마비키(まびき)의 사전적 의미다. 어떤 작물을 키우다 쓸만하지 않은 것들을 솎아낸다는 뜻이다. 그 솎아내기가 고립된 섬나라에서 '인간'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일본인들은 도망갈 곳이 없고 어떻게든 닫힌 공간에서 살아내야 했다. 발전한 경제에도 농민들의 생활은 그다지 나아지지 못했다.
에도 시대, 일본의 국가 경제는 매우 발전했다. 금, 은, 구리 등의 채굴과 수출이 활발했고 그에 따라 상업과 화폐경제가 발달했다. 그러나 발전된 경제에서 영주나 귀족층 일부만 혜택을 보았고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는 극심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무 배부르면 농사일을 싫어하게 되고,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곤궁해지면 흩어진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님께서는 향촌의 농민들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도록 주의해서 쌀을 잘 바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 에도시대의 저서 '승평야화(昇平夜話)' 중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농민 수탈을 '삼정의 문란'이라고도 했지만 사실 조선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는 비율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에도 시대 일본의 농민은 수확량의 50~60%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소작농이었다면 지주에게 또 뜯겼다. 에도(도쿄)에서는 품위유지 명목의 세금도 있어 80%를 뜯기기도 했다고 한다.
간척 사업과 치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도 발전하여 생산량은 무로마치 시대의 약 3배였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조선같이 기근이나 농사가 실패했을 경우 지원하고 나중에 되받는 환곡 제도같은 것도 미비했다. 일본의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 작았던 시기라고 한다. 낙수효과의 반례인 셈이다. 경제 발전의 과실이 아래로 전달되기는 커녕 발달로 인해 국가의 행정이 닿지 않는 공유지도 줄어들어 생활을 오히려 힘들게 했다.
이러한 고립된 섬나라에 가혹한 착취로 인해 생긴 영아 살해 풍습이 '마비키(まびき)'다. 또 일본의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같은 매춘 산업과 성관념도 이러한 농민 사회 수탈상과 무관하지 않다.
영아 살해 풍습, '마비키(まびき)'
전근대 사회의 삶은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삶과 매우 다르다. 정보통신과 교통도 미비했고 각종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만큼 가족의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가족의 확보는 노동력과 생산력에서 매우 중요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지금의 가치관보다는 가문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가족 확보의 중요성이 큰데 왜 에도 시대 일본은 영아를 살해한 것일까? 아이를 낳고 길러 노동력을 확보해서 얻을 이익보다 지금 당장 한 입을 더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세력을 확보해 이익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처참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국가에 도는 화폐가 증가함에도 경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회였다는 반증이다. 영주와 사무라이 계층을 먹여살려야 하면서 그들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닫힌 사회였다. 조총이 들어왔음에도 칼을 중시한 것도 이러한 구조에 기인한다.
에도 말기 농학자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는 "데와(出羽)와 오슈(奥州)에서 매년 1만 6~7천 명, 가즈사(上総)에서는 갓난아기 3~4만 명이 매년 솎아냄(마비키) 되고 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일본의 인구수는 약 3천만명대에서 유지되었다고 한다. 현대의 마비키 연구자인 Fabian Drixler는 한 해에 수십만명의 영아 살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출처 : 나무위키)
이러한 환경에서 하층 농민 사회는 "7세 이하의 아이는 신의 아이여서 언제라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식의 종교관 혹은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다. 닫힌 사회로 인해 허용된 공간만큼 주물된 관이다. 가라유키상을 비롯한 현재 일본의 자유로운(?) 매춘관에도 계통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메이지유신(1868) 때에 와서야 닫힌 벽이 제거되고 국력 증대의 필요성으로 마비키 습속은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악습의 관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지방에서 행정이 닿지 않는 범위만큼 계속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어떤 마을에서는 모든 집의 자녀가 '1남1녀'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이러한 문화에 의한 이해못할 범죄 사건도 있었다.

에도시대-솎아냄과 목각인형
일본 동북지방의 전통 목각인형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아이 솎아냄이 기원이라는 쪽...
blog.naver.com
에도 시대의 솎아냄과 목각인형의 유래에 대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arich77
동북의 대기근은 에도시대, 元禄、宝暦、天明、天保의 4대기근이라고 해 거기에는 예외없이 아이 살인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장래 노동력의 담당자가 되지 않는 여아는 솎아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갓난아이의 머리의 아직 부드러운 부분을 손으로 누르는, 鼻口에 젖은 종이를 붙이는, 얼굴을 유방에 억누르는, 목을 손으로 억누르는, 얼굴을 물에 담그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사랑스러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모친의 심정은 얼마나에서 만났는지요.
죄많은 모친들은 죽은 아이에게의 진혼 때문에, 또 스스로의 죄의 속죄와 영혼의 구제를 여래의 모습에도 세웠던 것입니다.목각 인형이 보이는 희미한 미소는 구세관세음 보살 여래의 미소였습니다.
에도시대-솎아냄과 목각인형 | 작성자 marich77 (위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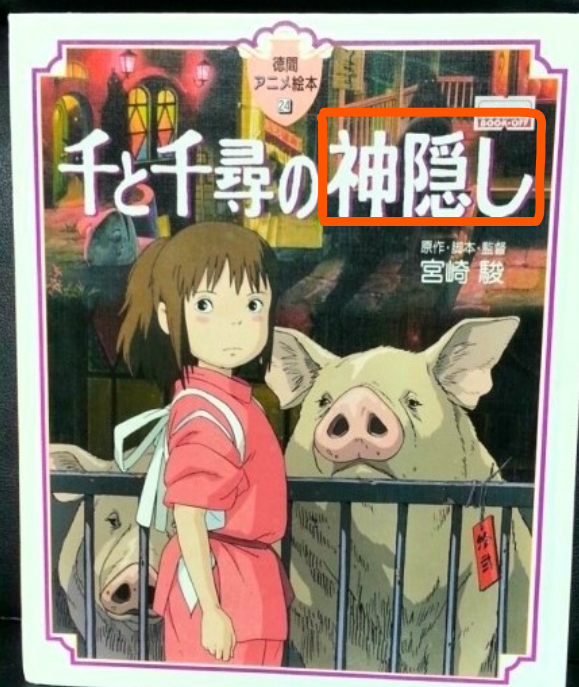
일본의 무기는 매춘으로 만들어졌다,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의 사전적 의미다. 19세기 후반부터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국가 차원의 취업사기, 인신매매로 팔려서 세계 곳곳의 유곽에서 일하던 매춘부를 칭하는 말이다. 동아시아·
toolofv.tistory.com
- 일본 제국 당시의 매춘부 산업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에 대한 포스트
일본의 자유로운(?) 성의 기원, 요바이(よばい) 문화
요바이(よばい) 문화의 사전적 설명은 야밤에 마을의 남자가 여성의 침실에 숨어 들어가는 풍습을 말한다. 주로 서일본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고대 일본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에서 유
toolofv.tistory.com
- 일본의 자유로운(?) 성의 기원 요바이(よばい) 문화 포스트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동렬의 구조론 연구소(1999~) (0) | 2025.01.22 |
|---|---|
| 일본 제국의 무기는 매춘으로 만들어졌다,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 (1) | 2025.01.21 |
| 조면기의 역설과 서울의 리어카 (3) | 2025.01.15 |
| 민주주의는 '-ism'이 아니라 'Democracy'다. (1) | 2025.01.12 |
| 복수왕 정유삼흉(丁酉三凶) 김안로의 공포정치와 그의 최후 (1) | 2025.01.06 |




